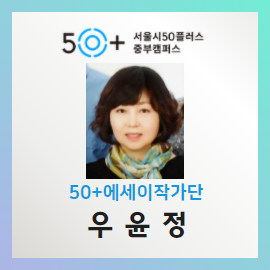1990년 서울시민이 되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타향살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공허했고 마음이 병들어 갔다. 그것이 낯선 풍경과 공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들이 그리웠지만,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도시의 이질적인 색과 냄새와 공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흙 밟기도 쉽지 않고 별 보기도 힘들다며 징징거리는 버릇이 그때 생겼다.
그 시절 고향에 내려갔다 상경할 때면 늘 눈물 바람이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던 숨 막히게 아름다운 놀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를 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008년의 봄도 생생하다. 그해 이른 봄,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고 나는 아팠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보려 해도 추슬러지지 않았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로부터 두어 해가 더 지났건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하루하루 피폐해졌고 매일매일 독해졌다.
내 독기에 내가 질식할 것 같았을 때 다다른 남산의 숲길, 그때부터 출근하듯 매일 그곳으로 달려갔다. 서설인지 폭설인지로 길이 사라지고 인적마저 끊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웃으면 숲이 따라 웃었고, 내가 울면 숲이 같이 울었다. 울다 웃다 울부짖다, 나는 차라리 한 마리 야생의 짐승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면 물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코를 킁킁거리면 나무 특유의 채취가 폐부를 찔렀다. 아름드리나무를 안고 있으면 그대로 나무가 되어도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난 후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힘들 때마다 숲을 찾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자연이 내게 넘치게 평안과 위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다만 마천루에 둘러싸인 서울 도심 한복판,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숲을 찾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했다. 여럿이어도 괜찮고 혼자면 더욱 좋은 것, 맑거나 흐리거나 심지어 비가 와도 상관없는 것,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 바로 산책이다.

사부작사부작, 어슬렁어슬렁, 있는 대로 해찰한다. 안녕 층층나무야, 안녕 애기똥풀아, 소리 내어 인사도 나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조용해진다. 복잡했던 생각이나 고민이 잦아들면서 이윽고 텅 비는 순간이 찾아든다. 그것이 ‘텅 빈 충만’임을 이제, 나는, 안다.
산책이 좋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순해지지 않았던 때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언 땅 밀고 올라오는 새싹을 볼 때마다 강철 같다며 나는 얼마나 감동했던가. 맨발로 땅 위에 섰을 때 발바닥을 간질이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에 얼마나 매료됐던가. 이름을 몰라 부를 수조차 없던 무명의 나무들과 꽃들, 그들이 뿜어내는 색과 향에 얼마나 황홀해했던가. 나무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행복이 밀려왔다. 시간은 멎고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슴 안에 가득 차올랐다. 잠시 후면 돌아가야 할 콘크리트 빌딩마저 감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 산책은 자신에게 참 야박한 내가 날 위해 해주는 선물이자 호사인 셈.
물론 산책을 해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준다. 견딜 힘을 얻고 웃음을 되찾는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갈 만하다고 믿게 된다.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멀리 묵색 하늘 위로 한 무리의 새들이 선을 긋고 날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마스크 단단히 여미고 산책에 나설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아직 살 만한 세상이죠? 나는 오늘도 산책길에 만난 스치는 인연들과 이심전심 무언의 인사를 나눌 것이다.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