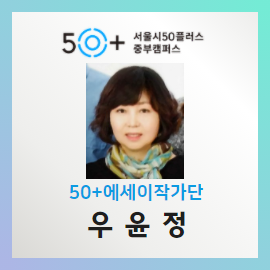죽어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었어. 나무가 좋았으니까. 나무가 좋았어. 언제나 좋았지. 이른 봄날 막 돋아난 새순은 꽃보다 보기 좋았어. 언 땅 뚫고 싹 틔운 걸 보노라면 눈물겹다가도 강철 같아서 탄성이 절로 났지. 연두가 초록으로 익어가는 것도 좋았고, 오색 찬연하게 단풍이 들 때면 어찌나 매혹적이던지. 잎 다 떨군 채 앙상해진 겨울나무도 근사했어.
돌아보면 내 유년은 늘 나무와 함께였어. 고향 집 마당에는 나무가 가득했지. 웬만한 유실수는 다 있었던 것 같아. 한 해 푸지게 수확의 기쁨을 주다 이듬해에는 성글게 열리던 대추나무, 크기나 맛은 형편없지만 생긴 것만큼은 끝내주게 예뻤던 똘감나무, 잠 못 드는 밤 내 창가를 지켜주던 늙은 포도나무, 석류나무, 앵두나무, 사과나무까지, 마당 구석구석에 잘도 숨어있었지. 나는 그 나무에 매달려 욕심껏 과육을 탐했고.

꽃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고 졌어. 동백이 하얀 눈 위에 핏빛 모가지를 똑똑 떨어뜨리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알록달록 봄을 알렸어. 목련이 추레하게 질 때면 장미와 철쭉이 꽃봉오리를 맺었고, 라일락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지. 구름 잔뜩 웅크린 날 유독 향 짙던 라일락이 질 무렵이면 곧 아카시아 향이 담을 넘었어.
수수한 채송화와 화려한 작약 뒤로 저 예쁜 줄도 모르고 피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는 야생의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박태기나무, 배롱나무, 조팝나무도 만만치 않은 꽃 미모 자랑했어. 매료되지 않을 도리 없지. 성찬을 즐기러 온 벌과 나비로 마당 깊은 집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색과 향에 무장해제된 나는 그들과 눈 맞추느라 밤이 이슥하도록 마당을 서성였지.
과실 아니어도 꽃이 아니어도 좋았어. 사시사철 푸르렀던 사철나무, 단풍드는 계절이거나 말거나 늘 검붉던 단풍나무, 근방의 암나무들을 수태시켰음이 분명한 위풍당당 은행나무, 구더기 퇴치용으로 푸세식 변소에 이파리를 내어준 오동나무,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새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품어주던 후박나무, 그리고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웠던 이름 모를 나무들까지. 나는 그들을 사랑했어. 몹시 사랑했어.

집 밖은 더 많은 나무들의 향연이었지. 친구들과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만났던 나무들을 기억해. 뽕나무 가지가 찢어지도록 휘어 오디를 따먹고 새까매진 혓바닥을 잘도 날름거렸어. 플라타너스 열매로 친구 머리통을 내려치는 바람에 절교를 당했던가. 아까시나무 잎을 누가 먼저 떨구나 내기하고 남은 줄기로 뽀글뽀글 머리를 말고. 놀다 지치면 꽃그늘 아래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어. 내 몸이 땅 밑 나무뿌리와 한 몸 되어 지구 반대편을 뚫고 나가는 꿈을 꾸었지.
좋아하니 알게 되는 것들도 생겨났어. 고흐 그림을 보며 측백나무와 향나무의 구별법을 배웠지. 은행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암수상열지사가 가능한 침엽수이고, 개나리가 토종 수목이라는 것. 아까시와 아카시아, 수수꽃다리와 미스킴라일락,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의 서로 다른 출신이나 억울한 사정 같은 것.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연인의 비밀이라도 알아낸 것처럼 신이 났었지.
왜 그리 좋았을까? 뭐가 그리 좋았을까? 한결같이 한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듬직했을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갸륵했을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붙박이라 애잔했나? 새든 벌레든 사람이든 싫은 내색 없이 품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타적 삶에 경도됐을까?
이유를 따져본 적 없이 좋았어. 그냥 마냥 좋았어. 다음 생이 있다면 나무가 되고 싶다 꿈꿀 만큼. 가끔 이 땅이 지긋지긋할 때면 윤동주 시인이 별을 헤며 패, 경, 옥 같은 이국의 이름을 부르듯 눈을 감고 나직이 바오밥, 베고니아, 유칼립투스, 메타세쿼이아 같은 이름을 읊조리곤 했어. 그러면 소혹성 b612나 마다가스카르 어디쯤으로 순간 이동하는 착각도 들었지. 그렇게 나무는 내 동경의 대상이었어. 여북하면 타샤 튜더가 워너비이고 그이의 정원이 로망이었을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 (다음 편에 계속)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