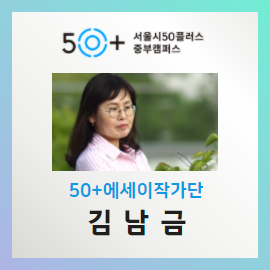지난 1월 초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폭설 예보가 있었지만, 오름 사랑꾼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꿈꾸었던 오름 여행을 접지 않았다. 중산간지역에 있는 따라비오름에서 내려왔더니 잔뜩 흐린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굵은 눈송이가 차 앞유리창으로 달려와 부딪치곤 했다. 함덕으로 접어들자 계절감을 잃게 하는 파란 하늘이 나타났다. 차창 밖으로 햇볕이 기세 좋게 빛났고, 해변 산책로에는 야자나무들이 햇빛 샤워를 하고 있었다. 뭉게구름을 품은 파란 하늘 아래 옥빛 바다가 펼쳐졌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제주의 겨울 햇볕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매서운 바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외투 깃과 소맷부리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었다. 햇볕의 세기와 바람 온도가 달라서 두 계절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혼란스러웠다. 겨울인지, 가을인지. 바람 막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바람을 헤치고 나아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름이, 햇빛이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함덕 해변은 바다와 오름이 어울려 이중창을 하는 곳이다. 해변 동쪽에 서우봉이 솟아있다. 해안에 있는 오름은 우도봉, 서우봉처럼 ‘봉’으로 불리고, 산간 지역에 있으면 ‘오름’으로 불린다. 서우봉 곁을 지키는 옥빛 바다는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 뛰어오곤 했다. 파도를 재촉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우봉둘레길 이정표를 따라 올라갔더니 해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둥근 해안선과 바다가 가을 하늘 같은 청명한 하늘을 이고 있었다. 옥빛 물에서 일어나는 포말은 바다의 속삭임 같았다. ‘나 좀 봐. 살아 숨 쉬고 있는 거 보여?’하고. 햇빛, 바다, 바람, 하늘, 구름이 서로 어울려 계절 따위는 잊으라고 합주했다. 자연의 지시대로 계절을 잊고 한동안 바람에 두 볼을 맡기고, 자연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110m의 야트막한 서우봉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다. 평화로운 산책로를 걷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군 진지동굴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을 만났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태평양 전쟁 때 제주도민의 땀과 고통이 서린 흔적에 닿는다. 낮은 오름에 뿌리를 내린 잡목 수풀을 헤치고, 굴을 파면서 느꼈을 두려움과 치욕을 헤아려 보았다. 이리저리 얽힌 나뭇가지에 매달린 푸른 이파리들이 좁은 동굴 입구를 둘둘 감고 있었다.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입구를 지나면 어둠과 만났다. 동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곧 등을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입구는 빛의 세계였다. 감탄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풍광 한가운데 역사의 검은 그림자가 자리 잡은 현장이었다. 전쟁의 광기에 휘말린 제주도민의 한과 자살 폭격에 동원된 이들의 넋이 어둠에 스며있다. 함덕서우봉해변의 그림 같은 풍경이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상처받은 영혼들의 진혼곡이 되기를 기원했다.

진지동굴에서 나와 봉긋한 서우봉 정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정상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여 360도 파노라마로 함덕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겨우 1백 미터 남짓 올라왔는데 하늘과 부쩍 가까워졌다. 머리 위를 뭉게구름이 담요처럼 덮어 찬기를 뿜는 바람을 막아주었다. 먼 바다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죽은 자의 집인 무덤 두 개가 앞에 펼쳐진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뻥 뚫린 시야를 선사하는 양지바른 곳에 묻힌 이들의 곁에, 벤치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금을 사는 이들이 서우봉에 올라 두 다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서우봉은 과거로 사라진 이들의 휴식처이자 현재를 사는 이들의 쉼터이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와 만나는 곳이고, 바다와 오름이 어울리는 곳이다. 두 세계가 화음을 내는 곳에서 깨닫는다. 잊고 싶은 과거 기억을 꺼내 현재와 마주하고 다독일 때 상처는 같이 지낼 만하게 된다는 것을.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