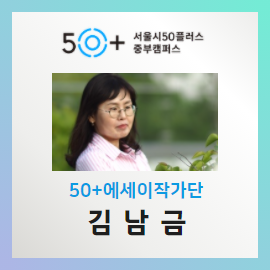빨강 머리 앤이 어느 날 아침, 초록 지붕 아래에 다락방에서 창을 열고 계절이 보내는 내음을 맡으며 말한다. ‘세상에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하면 멋지지 않나요?’ 앤과 같은 호기심과 들뜸이 중년에도 가능할까? 세상을 알 만큼 경험이 쌓여 계절의 변화에 둔감한 것은 아닐까? 바쁘다는 이유로 효율성만 추구하느라 무감한 건 아닐까? 슬그머니 어린 앤이 부럽다. 나이 드는 것이 가끔 절망적인 이유는 세상을 알 정도로 살았다는, 생각 탓인지도 모르겠다. 풍경을 표면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자극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앤이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같은데도 말이다. 호기심을 흔들어 깨우면 앤이 말하는 흥분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효돈천에서 앤의 호기심과 흥분을 빌렸다. 효돈천은 먼저 쇠소깍으로 접했다. 쇠소깍은 효돈천 하류이고, 제주도 말이다. 효돈 마을의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라 효돈 마을을 쇠라고 부른다고 한다. 쇠소깍은 효돈 마을 연못(소) 끝(깍)이란 뜻이다. 지명도 그 뜻을 알게 되면 평면적이었던 풍경이 종종 생생하게 다가온다. ‘시내’의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연못이라는데 어디까지가 시내이고 어디서부터 바다인지 구별할 수 없다. 둘의 경계를 애써 찾아내려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쓸데없는 짓이었다. 자연은 주변과 섬세하게 얽혀있는 숨은그림찾기 퀴즈 놀이이다. 이 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여행이 일상과 경계가 희미해져 여행이 일상에 스미고, 일상도 여행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쇠소깍을 바라보며 그 가능성을 탐했다. 쇠소깍 양옆으로 용암의 흔적이 보였다. 산책로를 따라 효돈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올레길 6코스에 속하는 길을 걸으면 효돈천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하류인 쇠소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돌 끝 사이에 작은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물이 없는 거대한 크림색 돌무덤이었다. 돌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쏟아져 흘러내린 모습 그대로 굳어 제주도가 화산섬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상기시켜주었다. 단단한 돌에 꾸깃꾸깃 제멋대로 잡힌 주름은 마치 종이를 두 손으로 구겼다가 펴면 생기는 주름 같았다. 크림색 돌은 마시멜로처럼 달콤하고, 만지면 매끈하면서 부드러울 것만 같았다.
효돈천은 어디에서 시작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초록 지붕 아래 사는 앤이 되었다. 효돈천을 따라 걸으니 효돈 마을로 접어들었다. 마을 옆으로 산책로가 계속 이어졌다. 유명한 곳은 어쩌면 슬픈 운명을 지닌다. 유명세를 치르는 쇠소깍에만 관심이 쏟아져서 진짜 효돈천의 모습이 외면당하곤 한다. 효돈천에 세 번째 갔을 때 비로소 쇠소깍에서 벗어날 생각을 했다. 효돈천을 따라 상류로 발걸음을 옮기면 내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로 넘친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 길을 지나면 마을 뒷모습이 나온다.

마을 뒤편으로 접어들었다. 왼쪽으로는 마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것처럼 자연이 만든 울타리가 버티고 있고, 오른쪽으로 바다로 열린 세계가 있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수평선이 펼쳐졌다. 이 수평선은 망망대해가 아니라 무한히 열린 가능성의 세계처럼 보였다. 늦은 오후 햇살이 산책로를 부드럽게 품어서 포근했다. 맑은 하늘이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바람, 바다, 햇살이 지휘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늦은 오후 나절의 내음을 찬찬히 빨아들이며 잠들어 있던 몸과 생각 세포를 하나씩 흔들어 깨웠다. 찰나지만 이런 낯선 기분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다니던 길에서 방향을 조금 틀면 새로운 것들로 넘친다. 늘 똑같았던 것이 갑자기 낯설게 보인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 스며있고, 그걸 발견하는 건 내 몫이 아닐까….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