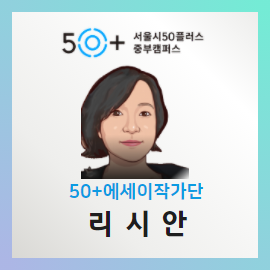열린 창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 올해도 어김없이 바람이 지친 땀을 걷어준다. 밤이면 매미 소리에 잠 못 들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가을이 다가왔다. 아파트 옆길에 있는 마트를 향하는 그 길가, 목련과 벚꽃을 보여 주던 그 길가엔 하나 둘 성격 급한 낙엽들이 뒹굴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며 어디에서 온 나무의 잎사귀인지, 어떤 곳의 나무가 바람에 따라 내 눈앞에 날아와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얀 목련은 목련인 줄 알았고 분홍 벚꽃은 누구나 벚꽃이라고 알았는데, 같은 자리에서 나뒹구는 낙엽의 이름을 모르니 꽃잎을 내어주었을 이름 모를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폭염 때문에 나뭇잎이 메말라 고사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천천히 9월쯤이나 되어서 와도 좋을 걸, 이 낯선 여름 8월 한가운데로 훌쩍 넘어와 우두커니 마주하게 되는 낙엽은 왠지 더 쓸쓸해 보인다.

또래의 지인들을 만나면 한두 명 안경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누구랄 것 없이 침침해진 시력과 노안의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남편들의 다초점 안경으로 바꾼 이야기부터 안경 알의 크기를 고르는 노하우도 알려준다. 비슷한 나이의 지인들을 만나면 아프거나 불편한 것들이 그저 일상의 하나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함을 이야기 하면서 어쩌면 모두가 "나도 그렇다"는 그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부터 핸드폰에서 글을 볼 때마다 안경을 빼고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 화면의 글자들이 예전 같지 않음이 느껴졌다. 이동할 때마다 핸드폰에 글을 쓰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계절에 급하게 낙엽이 바람을 타고 내 앞에 날아오듯이 노화가 어느 날 시작한 것 같다. 문제는 핸드폰 글씨 크기가 일 년 전과 같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좀처럼 글자 크기를 키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것이다. 우연히 내 핸드폰을 보게 된 지인들은 글자 크기를 키우라고도 했지만 바꿀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게 뭐라고, 마치 작은 글씨로도 잘 보겠다는 우습잖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자존심이라고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그렇게 애써 보려 했는지, 조금만 글씨를 키우면 될 것을, 아직도 보여지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돌아본다.
그러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며칠 전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 글씨 크기를 한 단계 키웠다. 검색 포탈의 글씨체도 키우고 카톡 안의 대화도 글자를 키웠다. 글자를 크게 바꾸는 것은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잘 보인다. 이렇게 한 번에 잘 보이는 것을, 그 몇 분의 할애를 못해서 오랫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다니. 어리석게 느껴졌다. 내가 하던 일들에서, 내가 생각하는 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온 나였기에 지금이라도 글자 크기를 키워 편해지는 것을 택한 것은 잘한 일 같다. 다만 화면에 큰 활자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글씨를 보려고 미간을 찌푸리고 안경을 올리거나 벗는 일은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조금만 융통성을 지니면 될 것을 나는 꽁꽁 싸매어 틀 안에서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했다.

습관과 고정관념은 세월에 굳어지는 성벽처럼 삶의 테두리를 단단히 봉쇄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의 사람들과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했다. 언제나 일정량의 눈과 비와 햇살이 쏟아져 땅의 건재함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장마가 지고 홍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줄 긋기처럼 약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줄 그은 틀 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
늘 먼저 걱정하고 문제가 오지 못하게 미리 방어를 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다. 살다 보니 싫은 상황과 맞닥뜨려야 하는 일상이 존재했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현실과 부드러운 타협도 필요하다. 좀 더 말랑한 우리로 변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계절이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가을은 잠시 기다려주었으면 좋겠다.
50+에세이작가단 리시안(ssmam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