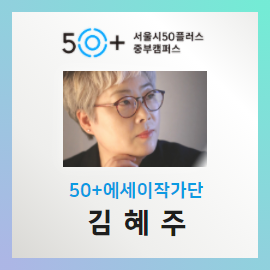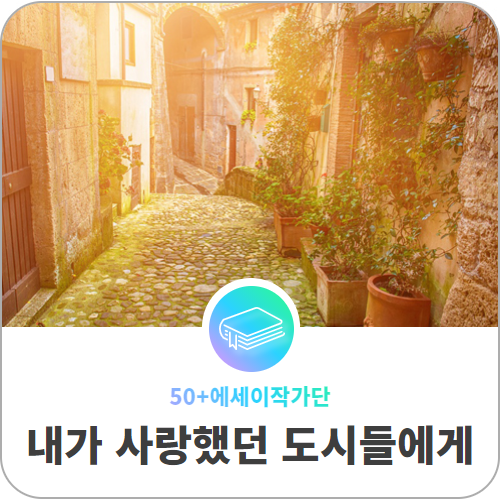
철길이 시작되는 노르웨이 보되역에서 느긋하게 트론헤임(Trondheim)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렸다. 열 시간 넘게 이동하는 여정이었지만,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다. 출발할 기차가 문을 닫은 채 서있었다.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노르웨이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어릴 때 개에 물린 적이 있어 선뜻 다가가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다. 올 블랙의 짧은 털은 녀석이 움직일 때마다 햇빛에 번쩍이며 윤이 났다.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지는 외모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녀석과 동행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던가. 기차표를 끊을 때 ‘no pet’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알 리가 없었던 나는 무작정 5번 객실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앉을 때가 되서야 출입문에 그려져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 그림이 생각났다. 녀석은 점잖은 모습으로 나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 일을 어쩌나……’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숨도 못 쉬고 얼어붙어버렸다. 겨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친 채 여차하면 줄행랑을 칠 태세로 녀석의 눈치만 살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아무것도 못하고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느라 진땀을 흘리는 나와 달리 녀석은 느긋했다. 차창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간간이 하품도 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제야 나도 긴장을 풀며 창밖을 힐끔힐끔 거렸다. ‘네 이름은 뭐니?’ 낯선 이국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는 녀석은 멋쩍은 표정으로 앞발을 들어 볼을 긁어댔다. 빠르게 스쳐가는 풍광을 놓칠세라 허둥대는 사이에 구름도 지나고 눈 쌓인 언덕을 지나 가을과 여름 속으로 기차는 달렸다. 낯가림이 있을 법도 한데, 상대를 편하게 대하는 매너까지 좋은 걸보면 녀석은 분명 남달랐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개와 함께 한 적이 없었고, 가까이서 접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곳을 같이 바라보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처럼, 지극히 평화로운 때에는 말이 필요 없다. 짧고 검은 털이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녀석의 등줄기가 늠름해 보인다.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생각에 잠긴 모습이 놀라울 뿐이다. 지나쳐온 길과 가야 할 길을 더듬느라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나와는 너무 다르다.
첫 만남부터 나의 두려움을 싹 걷어 갔던 녀석은 내게 친절한 눈빛을 건넨다. 말하지 않아도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먼 곳을 응시한다. 한날한시에 같은 도시로 길을 떠나는 인연에 대해 녀석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까. 탁 트인 곳, 눈을 두는 곳마다 대지와 구릉이 끝없이 펼쳐지며 겹겹이 둘러싸인 산 능선이 다가왔다 멀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짧고도 짧은 꽃의 일생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가끔 짧고 덧없음을 얘기할 때 나팔꽃을 끌어다 썼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급히 길을 걸으면서도, 넝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일은 꽃을 봐야지’ 하다가 기어이 꽃피는 순간을 놓쳤다. 그렇게 혼자 바쁜 듯 살았다.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그것들을 포기하며 그냥 지나쳤다. 무엇에도 집중하지 못한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헛일이었다.
녀석과 함께하는 동안 나팔꽃이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먼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찰나일지 모르는 짧고 속절없는 시간들이 녀석과 나 사이에 쌓인다. 열 시간 동안 장승처럼 생각에 잠겼던 녀석이 길게 앞다리를 뻗으며 기지개를 켠다. 신통방통한 일이다. 꽃피는 순간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녀석은 가볍게 몸을 털며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한다. 나도 짐을 챙겨 들고 녀석의 뒤를 따라간다.
50+에세이작가단 김혜주(dadada-bo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