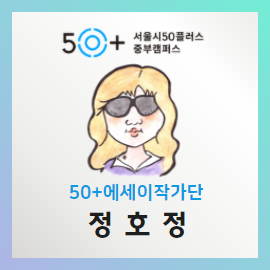지난 3월에 있었던 북콘서트
올해 1월. 나는 공적 출판물, 그것도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의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늦깎이 연극배우의 길에서 만난 벗들과 함께 「우리는 중년의 삶이 재밌습니다」라는 수필집을 세상에 펴냈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우연한 발견이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극 공연이 막혔고, ‘치유적 글쓰기’ 수업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처음엔 ‘시간때우기’ 정도로 여겼는데 점차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이들이 함께 그 경험을 활자로 되살려내는 과정을 즐겼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내 기억들이 누군가가 읽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되살아나는 경험은 특별했다. 무엇보다 ‘작가’라는 꿈이 나를 찾아왔다.
뒤늦게 시작한 글쓰기에 내가 이토록 빠져든 것은 분명 어린 시절부터 다져온 ‘책 읽기’ 덕분이리라. 언젠가 지역도서관 사이트에서 나의 도서대출 내역을 조회해봤다. 한 해에 평균 160권 정도의 책을 읽어왔음을 알았다. 나의 취미이자 특기인 ‘책 읽기’는 온전히 ‘명순언니 따라 하기’에서 시작되었다.

새 책 향에 이끌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출동
한 달에 한 번. 명순 언니는 우리를 뒤로한 채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외출했다. 아마 월급 받은 다음 날이었지 않았나 싶다. 밤이 깊어 귀가한 언니의 양손에는 책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넘쳤다. 할머니는 그런 언니가 마뜩잖아 보였는지, 돈 모을 생각은 않고 쓸 궁리만 한다고 타박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날이면 나는 언니보다 더, 언니의 새 책을 기다렸다. 책을 펼쳐서 코를 박고는 종이에 짙게 남은 잉크 냄새를 맡는 순간이 참 행복했다. 새 책 냄새를 많이 맡으면 기생충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명순언니는 집안일을 다 마치고 늦게서야 방에 들어왔다. 언니가 이부자리를 펴면 난 그 곁에 바싹 붙어 누웠고, 라디오를 켠 후엔 우린 빛의 속도로 책을 펼쳤다. 누구한테도 뺏기기 싫은, 우리만의 잠자리 의식이었다. 깊어가는 밤, 종알거리는 라디오 옆,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책에 푹 빠진 언니의 옆모습을 동화책 대신 하염없이 쳐다보기도 했다. 명순언니와 함께했던 그 고요한 시간이 내 안에 단단히 똬리를 틀었다. 그 똬리는 꽤 근사한 습관으로 내 삶에 자리를 잡았다.
며칠 전. 엄마가 모처럼 내 집에 오셨다. 난 엄마께 명순언니에 관해 물었다. “얼마나 영리했는지 몰라.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잡지에 소개된 희한한 요리도 척척 만들어냈지.” 엄마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명순언니를 칭찬했다. “걔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분명 크게 성공했을 거다…”
명순 언니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오빠 부부 밑에서 어렵게 컸다고 했다. 더는 오빠 밑에서 지낼 수 없게 되자, 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의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조른 끝에 우리 집으로 온 것이라고 했다. 무작정 상경을 택하지 않은 것만 봐도 언니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친정엄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명순언니가 늘 흥얼거리던 노래 ‘다락방’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높푸른 하늘 품에 안겨져 있는
뾰족지붕 나의 다락방 나의 보금자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속 한 문장이 떠오른다. ‘남자에게는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나 혼자 머물고 싶은 시간과 공간이 남자에게만 필요한 걸까? 지리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동굴이든 다락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곳에 숨고 싶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동경의 장소였던 청담동과 압구정동. 그 한복판에서 늘 종종거리던 명순언니는 자신만의 다락방을 얼마나 바라고 그리워했을지, 밤마다 다락방 대신 책에 빠져들었던 언니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녀의 나이 겨우 스물 언저리였는데…
이젠 일흔 살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 명순언니. 언닌 내게 높푸른 하늘 품 닮은 다락방 같은 존재로 늘 남아 있어요. 잘 지내시죠?
50+에세이작가단 정호정(jhongj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