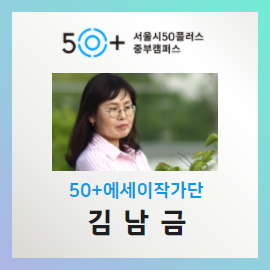머나먼 섬을 찾아가는 열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반도 최서남단에 있다는 가거도. 목포에서 뱃길로 233km나 떨어져 쾌속선으로 4시간쯤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섬.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도 저녁에나 닿을 수 있다. 무엇을 찾아 이렇게 멀리 가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해가 수평선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가거도항 선착장에 발을 내디뎠다. 곧 사위는 어둑해졌고, 작은 슈퍼 두 개와 숙박시설을 겸하는 식당 몇 곳의 희미한 불빛이 시선을 끌었다. 선착장에 늘어선 건물 몇 채가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것을 알려주었다. 작은 섬의 첫인상은 30년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다. 문득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된 것만 같았다.

시간이 멈춘 마을 입구에서 어둠을 가르고 달려온 트럭에 올라탔다. 삼 일간 머물 2구 항리 마을 펜션 사장님의 트럭이었다. 차 한 대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트럭에서 나온 헤드라이트뿐이었다. 구불구불 높낮이가 있는 좁은 길을 달리는 트럭에 호기심과 설렘을 가득 실었다. 달리는 순간에는 어딘지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달리다 보면 어딘가에 닿는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곳에 몸과 마음을 내려두면 그만이다. 어둠은 점점 짙어졌고, 바람 소리가 커졌다.
다음 날 아침 세월의 더께를 전시하듯, 오래전부터 먼지가 달라붙은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허름한 펜션은 항리 마을 항구에 있는 기암괴석의 품속에 안겨있었다. 펜션 지붕은 억새와 조릿대가 자라는 섬등반도를 이고, 아래로는 바다로 이어졌다. 펜션의 허름함마저도 자연의 부분이었다. 먼저 최서남단에 있는 등대를 찾아 원시림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펜션 윗길에 나무 데크 계단이 있었지만, 편한 길은 곧 끝이 나고 말았다. 이어서 펼쳐진 길은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풀과 나무가 주인인 숲이었다. 마치 밀림 속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슴 높이까지 오는 잡목과 풀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등산스틱으로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때때로 가시목이 버티고 있어서 안 찔리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다. 두 발을 안전하게 내려놓을 곳을 찾는 데 골몰했다. 나무 이파리들이 만든 지붕 아래 바람도, 빛도 차단되어 숲은 초록 이끼의 집이었다. 나무에도, 바위에도 반들반들한 이끼가 담요처럼 덮여있었다.

등대를 찾아가는 길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지나야만 했다. GPS를 가늠할 수 없는 고대인처럼. 빽빽한 숲길에서 도시에서 알았던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숲에서 필요한 것은 몸에 대한 감각과 운동 신경이었다. 자연에 순응하며 원시림을 걸은 지 두 시간이 지나자 확 트인 바다가 보였다. 하얀 등대가 바다를 지키며 서 있었다.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등대를 보자 안도가 찾아왔다.
이제 한숨 쉬어가도 괜찮다는, 안도였다. 목도 축이고, 땀도 식혔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독실산으로 가는 길은 바람이 많다는 3구 마을 대풍리를 지나는 길이다. 독실산까지 완만하고, 길이 잘 닦였지만 계속 오르막이다. 힘든 만큼 위에서 굽어보면 대풍리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하라고, 자연은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오르막을 오르면, 내리막도 만나고, 출발했던 곳에 다시 서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할 때 섬등반도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햇살은 변함없이 내리쬐고, 바다 뒤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석양에 반짝이는 억새와 조리대를 헤치고 걸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끈적한 바람 속에 두 발에 힘을 잔뜩 주고 버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뜬다.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듯이, 가거도는 서남단 끝인 동시에 시작인 곳이다. 어떤 열정이 고갈되면 또 다른 열정이 차오를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