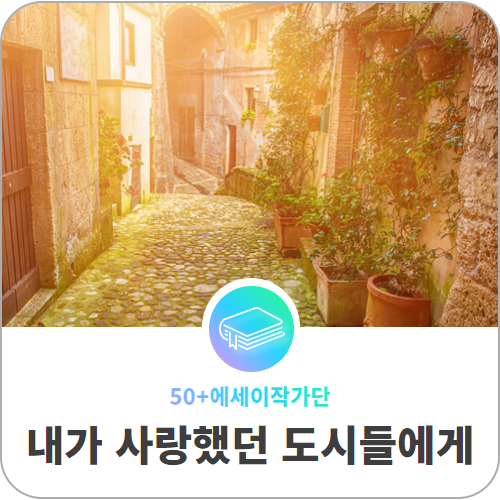
수많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에도 넵스키 대로(Невский проспект)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답다.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리나, 도스토옙스키의 라스콜리니코프, 고골의 단편에 나오는 인물들이 금방이라도 길모퉁이에서 튀어 나올 것만 같다. 이미 알고 있거나 오래전에 와 본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소설을 너무 읽은 탓일 게다.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지어진 거대한 바로크·로코코·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과 유유히 흐르는 운하에 반사되는 다리와 가로등이 무척 이국적이다. 한여름 밤, 발트해에서 몰려오는 안개와 며칠씩 계속되는 백야까지 더해져 여행자를 사정없이 들뜨게 한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운하와 수십 개의 섬을 잇는 수백 개의 다리가 있는 도시 풍경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강을 따라 걷다가 고풍스런 건물을 만났다. 말로만 들었던 ‘성 이삭 대성당’이었다. 황금 돔 지붕에 오르면 시내를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다는 말에 주저 없이 꼭대기로 향했다. 200개가 넘는 나선형의 좁은 계단을 빙빙 돌아 올라갔다. 카잔 대성당과 피의 사원, 에르미타주 미술관, 푸른 공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네바강과 건너편에 있는 토끼섬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3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살지 않은 늪지대였다는 말이 실감 나질 않았다.

그곳을 내려와 네바 강과 대성당 사이에 길게 이어진 가로수 길 벤치에 앉았다. 목이 말라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매점에서 팔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라도 놓칠세라 쫓기듯 돌아다녔더니 지쳐버렸다. 내 지도에 표시한 장소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가만 발걸음을 멈추고 보니 러시아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넓은 잔디밭에는 어김없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전혀 민망하지 않았다. 외려 푸릇푸릇한 젊음이 아름다워 보였다.
‘좋아! 무언가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바삐 돌아다녔으니, 그냥 멍하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여행이다.’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그곳에 앉아 키 낮은 풀꽃들을 바라보았다. 푸시킨과 도스도옙스키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성시킨 도시가 아니던가. 그리보예도프 운하를 따라 걷다보면 이름도 낯선 ‘피의 사원’이 보였다.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 부활 성당’인데 왜 그럴까 궁금했다. 사원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알렉산드르 2세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한 애칭이 붙었다. 모스크바 바실리 사원을 모델로 해서 여러 면에서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네바강 하구에 삼각주에 있는 토끼섬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도시의 중추와도 같은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요새가 있었다.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건설했다. 요새를 둘러싼 두꺼운 벽은 높이 12미터, 폭 4미터로 5개의 문으로 만들어졌다. 침략을 막는 요새로의 역할도 했지만 20세기 초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었다. 고리키와 도스도옙스키도 수감되었다고 했다. 요새 내부 성당에는 표트르 대제부터 거의 모든 러시아 황제들이 묻혀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황금빛 첨탑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처럼 보였다. 꼭대기에 십자가를 안은 천사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다. 토끼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강가에 햇살이 쟁강거렸다. 반짝거리는 동전들이 보였다. 주머니 속의 동전을 꺼내서 ‘피융’ 날리며 소원을 빌었다. 아마도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여행지에 넣을 때부터 찜해 둔 장소였다. 300만 점의 명화, 조각상, 유물을 소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이다. 알렉산드르 탑이 우뚝 서 있는 광장을 지나 에르미타주에 들어섰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고갱과 피카소의 작품들이 이어졌다. 미로 같은 마법의 방마다 보물이 가득했다. 에르미타주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했다. 너무 방대해서 다 볼 수 없기에 미리 준비한 목록을 들고 둘러보았다. 길을 잃어버려도 좋고, 어디에 머물러도 좋을 듯했다. 나는 끝도 없는 질문 하나를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도스도옙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두고 ‘고전과 퇴폐, 찬란한 아름다움과 우울함이 동시에 피고 지는 세속적인 도시’라고 말한 것을 조금 알 것만 같았다.
50+에세이작가단 김혜주(dadada-boo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