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오십도 한참이나 지나도록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유명해졌다’가 아니라,어? 어! 하다 보니 어느 결에 이 나이에 도달한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준비라 할 것도 없이, 준비할 새도 없이, 늙지도, 젊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나이가 됐습니다. 설상가상, 30년 가까이 밥을 구하던 일터에서 ‘거짓말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물러나 일 년 남짓 무위의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삶의 가을이 무척이나 쓸쓸합니다. 무엇보다 헐거워진 시간과 얄팍한 추억이 전해오는 막막함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낡고 오래된 책장 앞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살아오면서 다른 마음 둘 곳을 갖지 못한 탓에 책이 거의 유일한 동무이기도 한 때문입니다. 손길이 가는대로 아무 책이나 꺼내 읽다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책을 보는 동안에는 자괴감도, 배고픔도, 괴로움도 얼마간은 떨쳐버릴 수 있으니 이만한 벗도 없지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 기적적이었다 / 오랫동안 나는 곰팡이 피어 / 나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 질서 // 속에서, 텅 빈 희망 속에서 / 어찌 스스로의 일생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 다른 사람들은 분주히 / 몇몇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 넘겨보며 書標를 꽂기도 한다 / 또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살았다고 / 말한다, 좀 더 두꺼운 추억이 필요하다는 // (중략) 나를 /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 나를 떠나갔다, 나의 영혼은 /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누가 나를 / 펼쳐볼 것인가, 하지만 그 경우 / 그들은 거짓을 논할 자격이 없다 / 거짓과 참됨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 꿈꾸어야 한다, 단 / 한 줄일 수도 있다 //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기형도 <오래된 書籍>, 『입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제 책장의 가장 깊숙한 곳, 다른 책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한 구석에는 제 가난한 십대와 이십대가 오롯이 숨어 있습니다. 반 강제로 문예반에 들어가 처음 시라는 것을 써보겠다고 끙끙대던 까까머리 고교생 때부터 대학 문학반 시절 버스 차삯, 라면 값을 아껴 무턱대고 사 모은 시집, 소설 들이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래된 書籍” 들이지요. 아직 제대로 된 문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때 책 한 쪽이 넘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스무 살 무렵 저에게 온 시와 소설 들이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격정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좌절과 치욕을 담고 있는 시와 소설 들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시나 소설이 시대의 아픔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도 있었겠습니다. 어떻든 제 이십대의 연탄불 꺼진 단칸방과 혹독했던 밤과 치열했던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이들 시와 소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정처 없는 삶의 지남이 되고, 살아가야 할 힘이 돼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반짝이는 스무 살을 지탱해준 무엇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걸어가며 오래 기다려야 / 밝아질 것인가, 바람은 나를 끌고 / 자꾸만 깊어지라고 낮아지라 한다. // 숨소리 낮추면 문득 멀어지는 지난날 / 나는 어두웠다. 나는 정처없었다. / 흐리고 / 물기 자욱한 발바닥만 아파왔다. // 그렇게 세월이 갔다. 아무도 거기 없고 / 대답해주지 않는 내 몫의 그리움은 / 축축히 상한 가슴을 되돌리지 못했다. // 아프게 쓰러지고 어둡게 시들도록 /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마다 / 바람이 울컥 울었다. 내 등줄기를 치면서 // 어디 네 모르는 아픔들이 있었던가 / 다지고 다질 이름들을 잊지 말라고 / 팍팍히 저문 상처를 오래도록 두드렸다. // 눈물을 지우고 일어서면서 나는 / 이제까지 나를 따라온 바람의 / 절절한 목소리까지 기억할 수 있었다. // 얼마나 걸어가고 또 쓰러지겠는지 / 서툴디 서툰 발길을 시작할 때 / 모르게 어두워가는 생애가 환히 지워진다-서광식 <목숨> 중앙일보. 1991.
그리고 삼십대가 되고 사십대가 됐습니다. ‘글로 일가를 이루겠다’는 청춘의 치기어린 맹서는 백일몽처럼 홀연히 흩어지고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 -정확히는 말이겠지요. 스피치라이터니 말입니다-로 밥을 벌고, 벌고, 또 벌었습니다. 오십 끝자락에 이르러 더 이상 남의 글을 쓸 일도 없고, 더 이상 골치 아픈 정책보고서 등속을 읽을 일도 없으니, 돌아갈 곳은 제 팍팍한 젊은 날을 지탱해준 그 시와 소설 들이지 싶어집니다. “사랑도, 혁명도 흘러간 유행가 가사 같은”-서광식 졸시<너를 만나러 간다> 일부-이 시대에 속절없이 떠나간 제 젊음을 호명하듯 그 뜨겁고 서늘한 가슴 속으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 길에서 저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지난날 지나온 곳을 다시 찾아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것들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겠지요. 저 쉼 없이 흘러가는 한강만큼이나 시간이 많이 흐른 까닭입니다.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걸어서 다녔다/ 통인동 집을 떠나/ 삼청동 입구/ 돈화문 앞을 지나/ 원남동 로타리를 거쳐/ 동숭동 캠퍼스까지/ 그때는 걸어서 다녔다/ 전차나 버스를 타지 않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밑을 지나/ 마로니에 그늘이 짙은/ 문리대 교정까지/ 먼지나 흙탕물 튀는 길을/ 천천히 걸어서 다녔다/ 요즘처럼 자동차로 달려가면서도/ 경적을 울려대고/ 한발짝 앞서 가려고/ 안달하지 않았다/ 제각기 천천히 걸어서/ 어딘가 도착할 줄 알았고/ 때로는 어수룩하게 마냥/ 기다리기도 했다-김광규 <그때는 걸어서 다녔다> 『좀팽이처럼』 문학과지성사. 1988.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거의 다는 오십을 넘긴 분들이겠습니다. 제 글에 나오는 시와 소설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 만큼 천천히 ‘걸어서’ 가겠습니다. 보폭을 좁히고 ‘앞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니 외롭지도 않을 겁니다. 지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듯 50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와 소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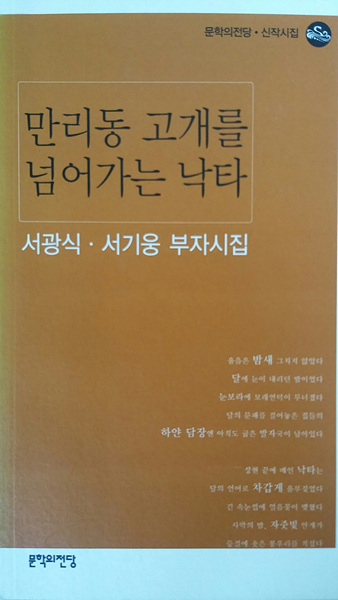
*소제목 “내 슬픈 전설의 59페이지”는 천경자 화백의 자서전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에서 차용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