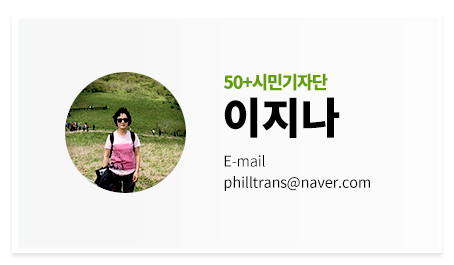시니어와 어르신 사이
-
얼마 전부터 헷갈리는 중이다. 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떤 모임에 속하게 됐을 때 내가 불리는 호칭 때문이다. 젊을수록 ‘특정’된 모습, 이를테면 스펙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는 활동과 역할에 따라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호칭은 젊은이들에게 다양하게 열려 있는 셈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누구든 전성기가 있고 맑은 날이 있다. 그런 날엔 비 오거나 궂은 날씨를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는 말을 새삼 곱씹는 건 뒤돌아봐서야 이게 그 말이었구나 싶어서다.
죽음이 남의 일이고 뉴스에만 존재하던 때, 젊을수록 자신과는 무관한 거라고 여기던 때 내 안에는 ‘젊음’이나 ‘건강’ 같은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한 건 의식되지 않는다. 결핍이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생각지 못한 인식을 낳지만, 채워진 곳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 충만한 에너지의 시간이기도 한 젊음과는 다른 곳에 다다른 것이다.
몇 년 전, 패키지여행이 한창이던 때 내가 신청한 상품의 여행 인솔자들은 여행객들을 각자 다르게 불렀다. 어떤 이는 사모님, 어떤 이는 고객님, 어떤 이는 선생님 등등…. 그전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의식하지 않다가 나 한 사람을 두고 저리 다르게 부르는 인솔자들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드가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가장 중립적으로는 ‘고객’이란 단어다. 돈 주고 여행상품을 샀다는,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말.
그런데 사모님은 영 거슬린다. 무얼 기준으로 그렇게 부르는 걸까?
선생님이라 불리니 부담스럽기는 해도 뭔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전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 사무실의 젊은이들이 부르기도 해서 조금 익숙한 탓인지 그나마 자연스럽기는 했다.(요즘은 주민센터나 민원실의 공무원들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시장에서는 불특정 ‘아줌마’에 불과하던 사람이 어디를 찾느냐에 따라 특정된 개인으로 위치하는데, 이것도 그나마 능동적으로 활동할 때의 얘기다.
처음 50대가 되었을 때 나는 그다지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고, 관계 맺은 이들도 한정적인 만큼 호칭은 특별히 달라질 게 없었다.
하지만 50 중반에 접어든 요즈음, 그동안 하던 일에서 벗어나면서 관계도 특정성을 넘어서자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한편으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실버 도슨트로 사회 공헌활동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이용하는 분들의 주 연령층이 70대다. 여기가 직장인 젊은이들에게는 이들이 조부모 뻘이기에 높여 부르는 호칭인 ‘어르신’인 게 당연하기는 하다. 노인인 분들이 당신을 ‘어르신’이라 부르는 게 뭐 그리 거슬릴 일이겠는가?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주 사소한) 문제다.
사실 호칭이란 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화의 결과인 만큼 젊은이에게 나이 든 이는 분명 ‘어르신’이긴 하다.
하지만 50대인 나에게도 그런 호칭이 주어지자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직업적으로 일하는 젊은이와 그 대상층으로서의 어르신이 대별된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분포가 다양하지 않으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을 누리는 대신 소수자로 남아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또 아주 많은 역할을 자기 안에 갖고서 살아간다.
어릴 땐 몰랐던 것들도 다른 시간대엔 알게 되듯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 안에서 하나둘씩 꺼내보고 만지고 알아가면서 자신의 한 인생을 완결 짓기에 누구라도 자기 안에서 젊음과 늙음을 상대적으로, 또는 시간 순으로 겪는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확인받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우리는 대체로 청년기 때 받아들인 정체성을 기준으로 사고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인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형식적인 곳에서는 늙음에 대해 과도하게 저항하게 마련이다. 나는 나이 듦에 대한 거부를 거부하고 싶다. 시간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불편해서다. 나이 듦을 가리려고 할수록 살아온 시간은 더욱 하찮아진다.
내가 거울을 통해 알게 되는 내 모습 중, 나이는 하나의 특징이고 살아온 시간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나이라는 숫자로 보는 나보다 그 안의 시간으로 보는 내가 돋보일 수 있어야 체험 부피가 늘어나고, 그래야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

(출처 : 클립아트)
노인을 공경하자는 말 따위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어떤 지향을 강권하기보다는 현재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 하나가 더 마음을 움직인다. 소수자나 약자를 존중하자는 말 대신 한결같은 태도가 더욱 믿음직하다. 계도보다 기본 설정의 변화가 실제적인 이유다.
현재 우리 사회는 수직성이 점점 약화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수평성은 그만큼 강화되는 중일까? 그 둘 사이에서 헷갈리는 세대, 특히 50대의 자리는 부산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나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벌써부터 (부쩍 늙어버린) 어르신으로 규정되어 버린다면 상대적 개념인 연장자, 손윗사람이라는 뜻의 시니어는 일찌감치 뒷방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닐까?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의 탑골 미술관 디자이너 이효정 씨(28)는 오는 10월 기획 전시 <안녕, 미래사람>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슨트들을 향해 질문한다. “‘미래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라는 이 씨의 질문으로 들여다본 어휘, 미래사람. 내가 속으로 떠올리는 동안 다른 이들이 대답한다. 사이보그, 인공지능. 로봇 등등.
하지만 내 추측대로, 이 씨의 ‘미래사람’은 노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일상을 확장한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낯선’ 어휘였기에 그만큼 색다른 감각으로 다가왔다.
노인이란 늙은이나 어르신의 동의어가 아닌, 모든 인간의 특질로서의 시간 주름 속에 지혜를 담는 한 개인으로 존중될 인생 선배이자 시민 선배여야 한다. 이미 노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투명 인간’투성이의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