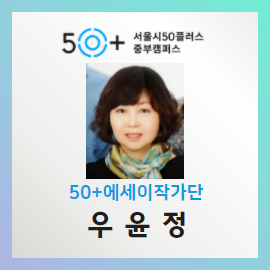어스름한 저녁 무렵 도착한 동네 어귀,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코가 벌름거리고 위장이 배고프다 아우성. 대문까지 달음박질을 쳤다. 손주가 온다고 할머니는 아껴둔 조기와 여름내 말린 나물을 광에서 꺼냈다. 그것도 모자라 해거름에 읍내까지 나가 돼지고기 반근을 끊어왔다. 푸지게 뜬 밥숟갈 위로 생선살이며 살코기를 연신 올려주셨다.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었다. 고봉밥 한 그릇이 뚝딱 사라졌다. 아이는 그런 집밥을 먹고 자랐다. 당연한 줄 알았다.

4교시를 마치는 종이 울리면 도시락을 받으러 교문 앞으로 달려갔다. 행여 친구들이 밥을 다 먹을세라 엄마는 본체만체, 도시락을 낚아채 한달음에 교실로 돌아왔다. 갓 지은 더운밥과 두세 가지 반찬이 다였다. 특별하지 않아도 연이틀 같은 적이 없었다. 더러는 다진 고기와 오색 채소로 맛을 낸 주먹밥이나 볶음밥이 담겨 있었다. 달걀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뒤 지그재그로 잘라 모양을 낸 특식이 그중 제일 좋았다. 엄마표 도시락은 언제나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아이는 아침에 싸달라며 심통을 부리곤 했다. 엄마는 손맛과 함께 음식을 담아내는 솜씨도 남달라 눈이 먼저 식욕을 느꼈다. 세상의 엄마들이 다 그런 재주를 타고나는 줄 알았다.
아이는 자라서 1인 가구가 됐다. 엄마 닮아 손이 제법 야물었다. 종종 친구들을 불러 시식을 강요했는데, 끝내 맛있다는 말을 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요리에 심취한 시간은 길지 않았고, 밥벌이의 고단함에 치여 곧 매식의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험난했다. 배가 고파도 점심시간에 식당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 시간을 피해 가도 혼자냐는 면박을 면치 못했다. 1인분은 안 판다 내쳐지기도 다반사. 그런 일이 잦아지면 치사해서 굶고 말지, 하는 날도 생겨났다. 그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다시 식당 문을 넘었다. 용케 한 자릴 차지해도 안 되는 것투성이였다. 최소 2인분이란다. 사정은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먹는 내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불편한 시선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됐다. 무시한 채 밥 한 그릇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계산을 마치고 잘 먹었어요, 부러 호기롭게 외치며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드는 생각은, 이런데도 먹고 싶니?

혼자 밥 먹는 게 지긋지긋할 때면 친구를 불러냈다. 그런 날이면 눈칫밥을 안 먹어도 됐다. 물론 매번 만남이 성사된 것은 아니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깨지기 여러 번, 이유는 식구들 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술자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결혼 25년 차인데 여전히 밥 때문에 싸운다며 식충이와 산다던 친구는 밥때가 되면 홀연히 사라졌다. 식충이를 위한 밥상 차리러 간 게 분명했다. 졸지에 난 술값을 내고도 찬밥 신세.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겪은 일들이다. 다사다난한 날들 끝에 나는 홀대하는 식당 주인을 눙치는 변죽이 늘었고, 타인의 시선에도 무심해졌다. 그 사이 혀는 미세한 감각을 잃었고 몸은 무너져갔지만 괜찮았다. 맛있게 먹는 밥은 다 보약이라고, 그렇게 위안하며 더는 집밥 타령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세상이 달라져 혼밥족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혼자 가도 환대하니 좋았고 아무거나 주문할 수 있어 좋았다. 딱 거기까지였다. 먹고 돌아서면 헛헛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집밥은 단순히 한 끼 밥이 아니니까. 세상의 어떤 밥집도 줄 수 없는, 오직 집밥만이 채울 수 있는 허기이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과 타고나는 줄 알았던 것의 속사정에 내 추억과 그리움을 더한 게 집밥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혼밥러다. 파릇했던 20대에 입문해 밥심으로 사는 나이가 됐으니 이력 꽤 깊다. 그리고 오늘부터 집밥을 짓기로 결정했다. 내 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자신을 돌보겠다는 선언인 셈. 나는 누군가가 매끼 더운밥을 해 먹이고픈 존재이므로 귀하게 여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쉰 넘은 자의 깨달음이라기엔 부끄럽지만 말이다. 가만, 그럼 냉장고에 가득한 엄마표 반찬은 집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