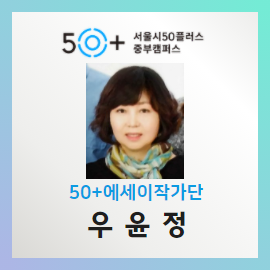예전 글에서 고백했듯 나는 벌레에 예민하다. 시골 마당 넓은 집에서 자랐는데, 그땐 안 그랬다.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당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벌레와 동거한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과장하면 ‘마당’이라 쓰고 ‘벌레’라 읽어도 된달까.
고향 화단에는 살찐 지렁이가 살았다. 비 오는 날이면 마당으로 기어 나왔다 날이 개고 햇볕 짱짱해지면 돌아가곤 했다. 습한 돌 틈이나 풀숲은 집을 짊어진 달팽이와 민달팽이 천지였다. 어디 그뿐이랴, 땅강아지, 쥐며느리, 노래기, 사마귀, 거미, 지네 등속이 마당을 즐겨 찾았다. 이름 모를 생명과 무당벌레, 메뚜기, 잠자리, 개미처럼 내 기준으로 벌레 축에 못 드는 애들 빼고 말이다.
내 안에 잔혹성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산목숨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장난도 쳤다. 비 그친 후 미처 사라지지 못한 지렁이 주위로 소금을 뿌려놓고 소금기에 온몸을 꿈틀대며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을 달뜬 눈으로 지켜봤다. 달팽이를 잡아 닭장에 던졌고, 풍뎅이를 눕혀 뱅뱅 돌렸으며, 만지면 공처럼 몸을 휘는 게 신기해 공벌레를 자꾸 건드렸다.
냄새가 심한 노래기나 발 많은 그리마가 살짝 징그럽고, 물리면 사마귀가 난다는 괴담 때문에 사마귀를 무서워하긴 했지만, 벌레에 낯가림이 심한 건 아니었다. 한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벌레를 끔찍이 싫어하게 됐는지, 도대체 오십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이러는 건지 당최 알 수 없다. 바퀴벌레를 만나면서 그리되지 않았나 짐작이나 해볼 뿐이다.

뜬금없이 벌레 얘기를 이처럼 길게 하는 것은, 이제 막 『혼자서 완전하게』라는 책 ‘내가 완전체가 된 날’ 부분을 읽었기 때문이다. 비혼의 작가는 말한다. “나는 이제 바퀴벌레도 치울 수 있는 여자야! 두려울 게 없어! 아무도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덤벼라, 세상아!”라고. 작가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진즉부터 ‘완전체’였다.
바퀴벌레와 마주쳤던 언젠가의 날을 기억한다. 알다시피 바퀴벌레는 빠르다.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보던 잡지를 던졌고, 그대로 명중했다. 그래놓고 하 세월, 저 잡지 밑 사체를 어찌 치우나, 죽으면서 알을 깐다는데 큰일 났네, 친구를 부를까, 세스코에 전활 걸까, 아예 이사 갈까, 걱정이 늘어졌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게 싫고, 싫고, 싫고, 또 싫지만 내 집에 사는 바퀴는 내가 잡고 내가 뒤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수가 불어나 창궐할 테니까.
화장지를 반 통 넘게 써서 어찌어찌 겨우겨우 비닐봉지에 넣고 새 봉지에 한 번 더 꽁꽁 싸맨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장에 버렸다. 무기로 쓰인 잡지도 같은 신세. 방바닥은 물론이거니와 내 손을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른다. 그러는 내내 진저리를 쳤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은 못 태워도 바퀴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면 기꺼이 태울 것 같았다. 초음파 해충퇴치기가 나왔다는 희소식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서둘러 집안에 들인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바퀴벌레를 처리해줄 애인을 들여놓으란 핀잔을 들었지만 모르는 소리, 남자라고 다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뒤로 다시 바퀴벌레와 조우했다. 책을 던지는 대신 주방으로 달려가 기름때 제거에 쓰는 세제 분무기를 들고 조준, 사정없이 쏘았다. 초음파퇴치기 때문인지 바퀴벌레가 부쩍 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제가 독한지 이내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 처리 방법은 이전과 대동소이. 나름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을 덜 쓰려 애써온 그간의 노력이 바퀴벌레 한 번 출현으로 무색해지고 말았다. 다행히 그 후 바퀴벌레가 더는 출몰하지 않으니 감사할 따름.
벌레를 대하는 태도야 사람마다 다르고 바퀴 따위 잡는다 해서 완전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1인분의 삶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안 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온전히 스스로 해내야 한다. 물론 1인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