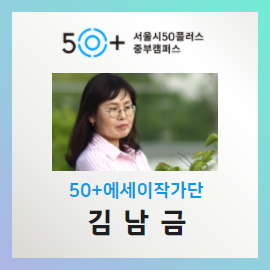떠남은 종종 설렘과 짝꿍이다. 여행은 마음의 상태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운길산역으로 가는 한 시간은 떠남이 갖는 설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여행의 본질은 이동이다.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이 시간’이야 말로 꿈꾸는 시간이다. 전철에 앉아서 배낭을 멘 삼삼오오 사람들의 활기를 얻고, 전철이 정차할 때마다 내리고 타는 사람들의 부산함을 바라보기만 해도 서울에서 멀어지는 걸 강하게 실감한다. 익숙한 일상적 공간을 뒤로하고 낯선 장소로 조금씩 다가가는 흥분을 조금씩 꺼내 음미한다. 전철 안과 밖 풍경을 느긋하게, 하지만 호기심을 가득 담아 즐기면 어느새 운길산역에 도착한다.

역사를 빠져나와 물의정원이 부르는 손짓을 물리치고, 운길산 자락에 있는 수종사로 먼저 발길을 돌렸다. 맑은 날이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수종사에 올랐다. 오르막에서 초가을의 투명하고 따가운 볕에 땀방울이 모여 흘렀다. 두 다리를 이용해 걸으면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흐르는 땀을 식히느라 문 닫은 다실의 툇마루에 살포시 자리 잡았다. 가만히 앉아서 고개 들어 위를 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수많은 기원의 말이 담긴 기와가 겹겹이 지붕을 이루었다. 담장으로 쌓은 기와에 빼곡하게 적힌 기원을 찬찬히 헤아려 본다. 이름 모를 많은 이들의 소망은 제각각이지만 소망하며 비는 마음의 뿌리는 하나일 터이다. 초자연적 힘에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살다 보면 종종 찾아온다. 나도 ‘묵언’이란 두 글자의 힘을 얻으려 눈을 감는다. 잡담과 잡념을 잠시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을 내게 허락한다.

마당을 지나 오백 년이나 버틴 수종사의 보호수가 버틴 곳에 다다랐다. 거대한 보호수가 지닌 뚝심을 헤아려 본다. 똑같은 자리에서 셀 수없이 많은 계절 바뀜을 견디며 키워낸 굵은 아름을 닮고 싶어 탐하는 시선을 보낸다. 나무는 늘 변화하는 계절 속에 서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항상성을 보여준다.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불변성이 부러워 우러러보는 마음이 솟는다. 수종사에서 걸어서 내려오는 길은 만만치 않지만, 아름드리나무를 본 후라 고단을 외치는 호들갑을 잠시 접어두었다.
걷고 걸어서 ‘물의정원’에 가까이 갔다. 정원 입구에 있는 이정표를 지나 습지 위에 있는 다리는 두 세계를 나눈다. 다리를 건너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꽃밭 세계가 펼쳐졌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밭에 서 있는 황화코스모스가 인사를 건넸다. 사람도 꽃밭에 묻혀 꽃이 되었다. 꽃들 사이 폭 파묻혀 꽃과 하나가 되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 틈에 서둘러 합류했다. 분주하게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마저도 달콤할 정도다. 자연과 사람의 사이좋은 어울림에 기분이 날아올라 어느새 이리저리 폴짝거렸다. 꽃밭 성찬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나비가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도 그 순간 나비가 되었다.

꽃밭은 강변을 따라 이어지고, 강변을 따라 있는 잔디 위에는 하루 여행자의 여유가 뚝뚝 흘렀다.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 흐르는 강물에 시선을 맡겼다. 무언가를 보려고 애쓰지 않고, 힘을 빼고 물 흐르는 대로 마음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시간은 서울에서 떠나 하루 여행자가 되어 만나는 것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떠날 때는 설렘을 누리고, ‘여기’ 있을 때는 ‘저기’를 잊는 여유를 갖고, 돌아갈 때는 설렘과 여유가 남긴 뒷맛을 음미한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두 다리의 무게 때문에 나른하지만, 이 나른함도 하루 여행자에게는 선물이었다.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