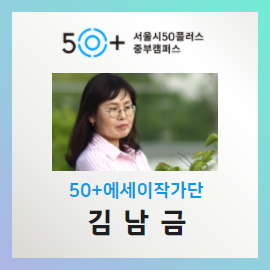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라 올해 돈키호테의 후예가 되기로 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는 데 시간과 열정을 바쳤다. 앞으로 가려면 펼쳐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올 한 해도 끝이 보인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설다. 길을 잃고 서 있는 것 같다. 책에서 수집한 문장 사이로 들어가 길을 찾아보고, 지인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헝클어진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그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명쾌한 답도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을 때, 태안반도에 있는 신두리해안사구에 갔다. 사구는 반복이 만든 변화이다. 바다에서 해안으로 부는 바람이 모래를 조금씩 멀리 옮긴다. 모래 알갱이들이 떠밀려 해안에서 먼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바닷바람이 오랫동안 분 탓에 모래 알갱이들이 길을 떠나 다른 곳에 모래밭을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모래 알갱이가 쌓여서 마침내 모래 언덕으로 변신해서 시선을 잡아끈다. 모래 언덕 주변을 둘러싼 모래밭도 점점 넓어지고, 모래밭에서 살 수 있는 풀과 식물도 생긴다. 식물도 하나둘씩 모여서 군락을 이루며 식물 동산을 만든다. 식물 동산이 모여 골을 이루고, 이 골은 바다를 감춘다.
사구의 생성 과정은 길을 잃는 일 같다. 보통 길을 잃으면 당황스럽고 두렵다. 하지만 사구가 만들어지는 길 잃기는 다른 길로 이끄는 기분 좋은 초대이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익숙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경험이지만, 길을 잃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선 것이 새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다. 사구에서 길 잃을 잃는 것은 새로운 것과 인사하는 유쾌한 헤매기이다.

신두리 해안에 넓게 펼쳐진 모래밭 위를 걸으면, 해안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모래 평원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다. 야트막한 모래 언덕에는 억새와 키가 큰 풀이 자란다. 언덕과 언덕 사이에 모래 골도 생긴다. 이 모래 골로 들어가면 하늘 아래로 펼쳐진 것은 모래 무덤이다. 모래 무덤만 보고 있으면 바닷가에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게 된다. 어디에 있는 건지 헷갈릴 무렵, 작은 골에서 벗어나게 된다. 갑자기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새삼 깨닫게 된다.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비하다. 길 잃은 곳에서 길을 찾는 법을 슬며시 알려준다. 이때 준비물은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마음이다.
일상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티도 안 나는 반복적인 일로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일이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은 바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 때이다. 차이를 만들 것 같지 않았던 반복은 모래처럼 켜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 언덕을 이룬다. 이 언덕은 더는 지루한 반복이 아니다. 이 언덕은 무너뜨릴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되어 도드라진다. 변화가 요원해 보였던 반복을 버티는 지구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진부한 말이 살아서 성큼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초겨울 오후, 노란빛이 풍부한 햇볕에서 뻥튀기 과자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걷는다. 반짝거리는 볕이 사구에 터를 잡은 풀에 가 닿는다. 눈이 부셔서 앞도 잘 안 보이고, 지형도 한눈에 볼 수도 없다. 전체를 파악하려는 욕심을 얼른 접고, 두 발이 데려다준 곳의 풍경만 즐기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애정을 듬뿍 담은 시선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로 한다. 일부러 애정을 담아 바라보는 곳에서 잃었던 길을 되찾는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달이 쌓여 한 해가 된다. 해가 쌓여 인생이란 언덕을 만든다. 나는 지금 가는 해와 오는 해가 만든 ‘시간의 골’ 사이를 거닐고 있다. 담담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50+에세이작가단 김남금(nemon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