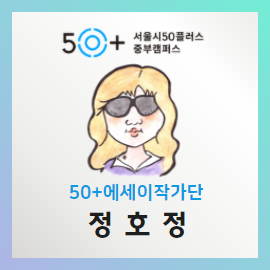‘가을비는 장인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비는 잠시 오다가 그치고 만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렇다고 그 비를 가벼이 보아 넘기긴 어렵다. 떠나가면서 매서운 추위를 데려다 놓기 때문이다. 이럴 땐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세탁소 비닐에 쌓인 코트와 패딩점퍼를 냉큼 꺼낸다. 수면 양말도 끼워 신고 연신 따뜻한 차를 홀짝거린다.

오늘처럼 격하게 계절감을 느끼는 날이면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강조하던 중학교 지리 선생님이 떠오른다.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교련 수업도 병행했던 분이다. 교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학생들의 귀밑 1cm 단발머리를 자로 쟀다. 그는 날 선 가위를 들고 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귀 옆머리를 잘라댔다, ‘싹둑’. 귀 위 1cm 단발머리를 하게 된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러니 지리 선생님이 학교 정문에 나타나기라도 하는 날은, 계절에 상관없이 학교생활은 납량특집으로 돌변하곤 했다. 납량특집?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엔 누구에게나 납량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살았던 것 같다. 배경이 학교의 변소든 동네의 버려진 우물가든 말이다. 물론 내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오싹한 이야기가 있다. 변소나 우물가가 아닌, 최신식으로 늘어선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막 나의 사춘기가 시작된 즈음, 지방으로 발령받은 아버지는 청담동 집을 급히 팔았다. 아빠는 어린 남동생과 여자들만 입에 남아있는 불안감에 단행한 그 결정으로 부모님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우리 집은 압구정동 한복판에 자리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급작스럽게 구한 집이라 이전에 살던 주택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층집 규모의 살림을 반으로 줄여야 했고, 명순 언니와도 이별해야 했다. 심란한 어른들과 달리 우리 삼 남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렇게 슬슬 아파트 생활에 적응할 때쯤이었다. 부엌방을 독차지한 남동생이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쳤지만, 동생의 ‘귀신 타령’은 갈수록 심해졌다. 보다 못한 엄마는 나를 동생이 지내던 부엌방으로 보냈다. 어쩌다 내 방! 혼자만의 방을 갖게 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의 우상 ‘레이프 가렛’의 포스터도 여기저기 붙이고 만화방에서 빌려온 만화책들을 마음껏 늘어놓고 볼 수도 있었다.
중간고사를 앞둔 그 날, 여느 때처럼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깊은 밤을 깨고 ‘땡’ 하는 엘리베이터 도착 음이 들렸다. 그리고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아파트 복도를 향해 난 창문을 넘어오는 또각또각또각, 그 선명한 소리는 딱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멈췄다. 분명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순간, 머리카락 아니 머릿속 잔털까지 전부 쭈뼛하고 서버렸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중간고사를 끝낸 날. 만화책 한 질을 통째로 빌렸다. 거침없이 읽기 시작해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또 시작되었다. 또각또각... 역시나 우리 집 현관에서 멈췄다.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썼다. 동생이 말한 ‘귀신’이 이것인가 싶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인가 하이힐 소리는 우리 집 앞에서 멈췄다. 엄마께 얘기하고 싶었지만, 동생처럼 야단을 맞을 것 같아 그 뒀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비 오는 늦은 밤이었다. 나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마루에서 누군가 박자에 맞추며 탁자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깼다. 동생의 장난이라 여기고는 시끄러우니 들어가 자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곧 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나는 “누구세요?” 소리를 냈다. 대답 없는 누군가를 향해 누구냐고 계속 물었다. 그때, ‘삐걱’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부엌방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방문 앞에서 딱 멈췄다. 난 이불을 확 뒤집어썼다. 차마 이불 밖을 내다볼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소환해 기도했다. 기도가 통했는지 싸하던 느낌이 사라졌다.

연이어 일어난 그 일들은 나만의 비밀로 남았다. 덕분에, 전등불을 끈 깜깜한 공간에선 잠들지 못하고 무서운 영화는 절대로 못 보는 겁보가 되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는다. 구태여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설명하려고도 애쓰지 않는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하나쯤 내 삶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 그런 영역의 이야기를 괴담이라 부르든 미스터리라 부르든,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공존하는 이상, 그런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죽음에서 살아나 되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에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하나 보다. 그 호기심 덕분에 인류는 계속 변화하면서 무한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그 오싹한 순간들을 은밀하게 혹은 애틋하게 불러내어, ‘나의 살던 고향’을 오롯이 추억하는 게 아닐까?
50+에세이작가단 정호정(jhongj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