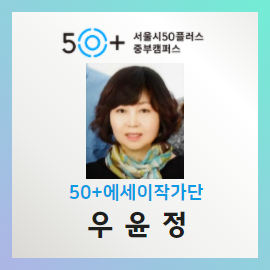일이 바빠지면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왜 그리 많은지. 전화통도 자주 울린다. 그러다 한가해지면 매사에 심드렁해진다. 지인들 연락마저 뜸해진다. 쌀이 떨어지면 하다못해 화장품이라도 바닥을 보이고, 불행이 저 혼자 아니고 누군가와 어깨동무하고 오듯이 말이다. 아, 이게 아닌데, 이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

최근에 너무 바빴다. 원고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회사의 50년사 원고를 끝내야 했고,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 글 한 편을 제출해야 했으며,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했다. 순위를 매기자면, 1순위 백신 접종(수요일), 2순위 에세이 작성(목요일), 3순위 사사 원고 마감(8월)이랄까. 그 후 자유롭게 날아오를 작정이었다.
시간을 아끼려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몇 달째 공을 들여온 집밥을 매식으로 대체했고 제일 좋아하는 산책까지 접었다. 일 끝내고 떠날 여행지를 검색하는 일도 그만뒀다. 집밥은 그렇다 쳐도 산책을 참기란 쉽지 않았다. 한낮은 여전히 더웠지만, 아침저녁으로 달라진 공기와 바람결은 사람 환장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더없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환상적인 저녁놀을 욕심껏 탐닉하고 마음껏 매혹당하고 싶었다. 까짓 1시간이면 충분했을 터지만 마감에 대한 강박은 잠시의 외출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일에 집중했어야 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집으로 돌아온 날, 자꾸만 몸이 늘어져서 한참을 누워있었다. 팔이 좀 뻐근했지만,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그랬으면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어야 했다. 1순위를 해치웠으니 2순위를 진행했어야 옳다.
머리카락이 사달이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몇 개의 강박을 안고 있다. 그중 하나가 벌레다. 모기나 파리 외에는 잘 못 죽인다. 벌레가 출몰하면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공간이야 나눠 써도 좋다만 발각되진 말아야지 얘들이 예의가 없다. 내 눈에 띄지 않으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내 눈은 벌레에 밝다. 눈에 안 띄는 구석 자리 돌아나가는 모퉁이에 숨은 벌레를 내 눈은 어김없이 잡아낸다. 길거리를 가다 로드킬 당한 비둘기나 바퀴벌레 등속의 사체는 가장 먼저, 내 눈에, 확, 들어온다. 같이 걷던 이는 보지 못한다. 그들이 투명한 존재도 아닌데, 동행이 청맹과니도 아닌데, 내 눈에만 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마룻바닥에 길게 누운 머리칼 한 올이 신경을 거스른다. 기어이 그놈의 머리카락을 주워 휴지통에 버려야 직성이 풀린다. 강박은 강박의 강도를 배가시키는 법, 하여 짐짓 의연한 척 해보지만 뇌는 속지 않는다. 가끔은 노안이 고마울 지경.
머리카락을 줍는데 거미줄과 거미가 보였다. 곧 청소모드에 돌입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백신을 맞았으니 쉬어야 하는데, 내일 제출할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입으로는 그리 말하면서 이미 내 손엔 청소기가 들려 있었다. 그랬으면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수명이 다한 듯 침침해 보였고, 이불 군과 베개 양은 보송기를 잃은 채 눅눅해 보였다. 테이블에 둔 컵은 여전히 얼음, 누군가 땡,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콩쥐의 독처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몇 번을 닦아도 그다지 빛날 것 없지만 닦지 않으면 남루한 살림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안 할 수 없는 집안일. 나는 손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다. 쓸고 닦고 돌리고 광내고. 그러는 내내 미쳤지, 돌았지, 제정신이 아니지, 몇 번이나 혀를 찼는지 모른다.
그예 밤새 끙끙댔고 정오가 다 돼 일어났다. 무리했으니 당연했다. 그리고 8월 19일 18시 46분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다. 원래는 정오까지 제출했어야 했다. 이 글은 곧 끝나겠지만 하나도 개운하지 않은 건 3순위 숙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아까부터 몹시 신경 쓰이던 설거지감들을 해치워야 하겠지.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오늘도 죽이게 아름답다. 그 하늘을 올려보며 불쑥 나온 말,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요즘 아내들의 실체를, 나는, 모른다.
50+에세이작가단 우윤정(abaxial@naver.com)